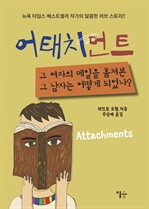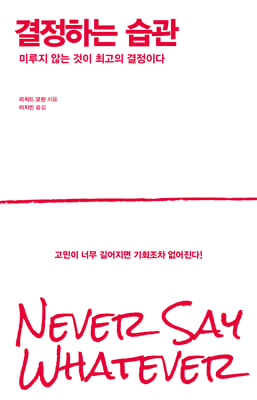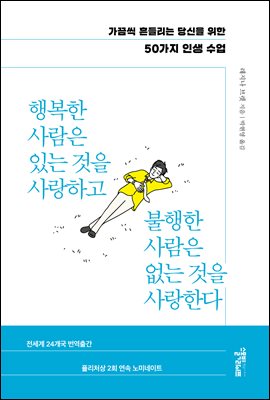명작 스캔들 2
- 저자
- 장 피에르 윈터, 알렉상드라 파브르
- 출판사
- 이숲
- 출판일
- 2013-11-02
- 등록일
- 2014-10-1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명작의 본질을 파헤치다
2011년 초 출간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작 스캔들 1』의 뒤를 이은 두 번째 명작 해설서. 1편이 대표적인 서양 예술가 열세 명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그들의 작품을 소설 같은 필치로 감동적으로 그려냈다면, 이 책은 「밀로의 비너스」에서부터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통조림」에 이르기까지 모두 30편의 명작을 조금 깊숙이 들여다본다. 이 책의 부제가 말하듯 저자들이 주목한 문제는 ‘명작은 왜 명작일까?’라는 질문에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세상에는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 공들여 잘 만든 작품이 얼마든지 있는데, 유독 몇몇 작품만을 ‘명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미술사적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통해 이런 의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는 탁월한 명작 해설서이다.
미술사가와 정신분석학자의 만남
이 책의 저자 장 피에르 윈터는 라캉의 제자로서 프랑스 파리에서 프로이트 학파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정신분석학자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공동 저자 알렉상드라 파브르는 미술사를 전공하고 오랫동안 문화적 이슈에 천착하여 글을 써온 저널리스트이다. 각기 다른 전공분야에서 공동의 주제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일반적으로 명작에 부여하는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명작의 개념이 반드시 작품의 우수성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감상자가 예술 작품에 매료되는 이유가 반드시 작품의 완성도 때문만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밀로의 비너스」만 해도 얼굴은 남자 같고, 가슴도 빈약하며, 허리도 길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신’이라고 부르기에는 모자란 구석이 많다. 게다가 두 팔이 잘려나가 ‘완성품’이라기보다는 ‘파손품’에 가깝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인류 문화의 대표적 명작이라고 부르고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들은 명작의 가치가 작품 자체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의 숨겨진 욕망이 얼마나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작품이 감상자의 무의식과 의식에 무엇을 어떻게 호소하느냐에 달렸음을 확인한다. 특히, 저자들은 해설의 대상이 된 30편의 명작을 고를 때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들을 선별했기에 독자들은 익히 알고 있는 작품들을 전혀 다른 시선을 바라보는 신선한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명작은 스캔들을 낳는다
프랑스어로 ‘명작’을 의미하는 ‘셰되브르(Chef-d’euvre)’는 원래 오랜 세월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실력을 갈고닦은 도제가 수련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 선보이는 최종 최고의 작품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목격하듯, 각고의 노력 끝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탄생한 작품은 당대에 외면당하거나 망각의 창고 속에 처박히기 일쑤다. 그리고 대부분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작품이 명작의 반열에 올라가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반복된다. 드라투르가 그랬고, 페르메이르, 쿠르베, 마네, 반 고흐, 뭉크의 경우가 그랬다. 어느 시대에나 천재적인 작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비난과 야유 혹은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명작의 탄생은 늘 스캔들이 되곤 했다. 왜 사람들은 한 시대를 뒤흔드는 천재와 그들의 명작이 탄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을까?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이런 현상을 우리 내면에 숨은 근원적인 욕망과 금기의 메커니즘을 통해 탁월하게 분석한다. 독자들은 그동안 명작을 감상하면서도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들, 왜 명작은 명작이며 왜 명작은 스캔들이 되어야 했느냐는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명작을 이해하는 일은 감상자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일인 만큼, 이 책은 독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흥미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